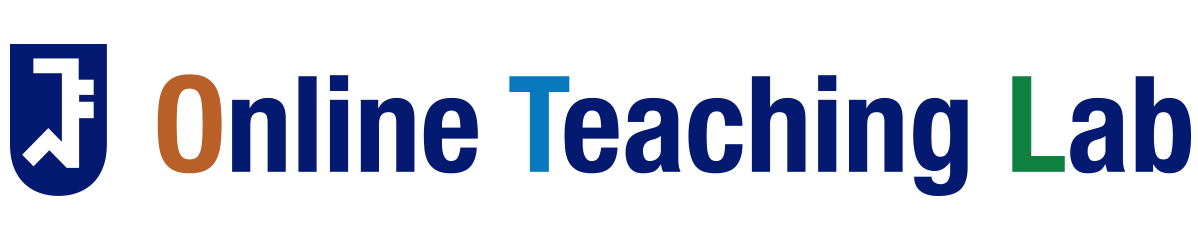토론은 어렵다. 보통 가정에서 토론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소통 행위를 체험하고 배우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초중고 학창 시절의 토론 수업은 요식적 커리큘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험해보지 않은 무엇은 어렵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더 어려워졌다. 토론 상대와 서로 만나지도 못한 채로 토론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상상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멀게는 <스타워즈>, <스타트랙>과 같은 공상과학영화에서부터 가깝게는 마블의 <어벤져스>까지. SF영화에서 ‘비대면 토론’이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같이 자연스러웠으며 위화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홀로그램은 마치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거추장스러운 헤드셋과 마이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비대면 토론’은 서로 동시에 격하게 말을 주고받아도 이른바 ‘오디오가 겹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소통이었다.
아쉽게도 현실은 상상과 자못 다르다. 아직 우리는 토론 수업에서 홀로그램과 같은 기술적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우리에게는 줌(zoom)이 있다. 문제는 줌을 이용한 원격 토론 수업이 홀로그램보다는 종이컵과 실로 만든 전화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조금 더 가깝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와 종이컵 전화기로 토론을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런 독특한 상황에 요구되는 주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야만 할 것이다.
먼저 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실시간 소통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실제 대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줌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언제 끝나는지, 또 정말 발언이 끝나기나 한 것인지 즉각 알기 어렵다. 이런 요소는 토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토론은 서로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견주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줌에서의 갑론을박은 빠른 리듬으로 오가던 말이 서로 중첩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고 그렇게 겹친 말들은 그 소리가 그저 상쇄되어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줌에서의 토론은 실시간이 아니라, 마치 종이컵 전화기처럼 턴(turn)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서로 토론과 대화에 임할 의사가 있다는 중요한 ‘표시’로 기능한다. 그런 표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토론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회의에 빠진다. 줌에서의 토론은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물론 물리적 거리의 대체재가 있다. 공간적 인접성이라는 핵심적 요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표정, 몸짓, 시선 등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이제는 그것들이 ‘표시’의 전부가 된다. 이는 역으로 평소라면 문제 되지 않았을 모습이 자칫 발화자에 대한 경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줌에서 토론할 때에는 발화내용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보이는 모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토론은 어렵다. 줌에서의 토론은 한층 더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토론은 현재로선 영화에서나 묘사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괜찮다. 줌을 이용해 토론하는 오늘날의 모습 역시 과거에는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을 터이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코드다.
글쓴이: 최 건,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