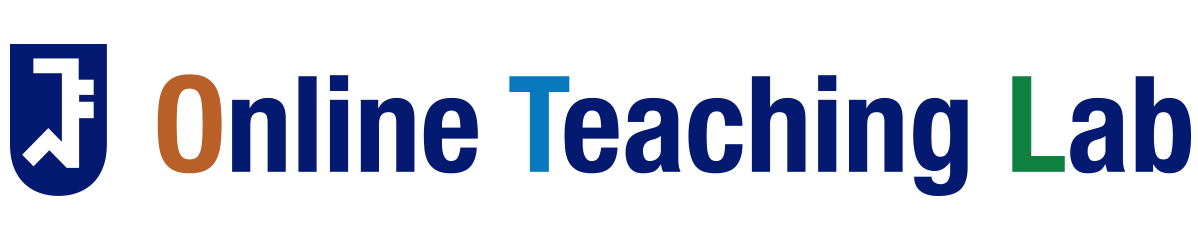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담당할 때 매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다른 학문 영역에도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정치학은 특히나 ‘관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말이다. 차이와 갈등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정하고 익히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계기의 얽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내용을 강의실 밖에서의 관찰, 경험, 고민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현상을 개념과 이론을 통해 비추어보고, 반대로 개념과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현상의 모호함과 복잡성을 인식하게 된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곧 정치적 판단을 위한 훈련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결정은 대개 정답을 찾아가는 풀이의 과정이 아니라, 판단기준이 논쟁적인 상황에서 의견과 의지를 수합, 설득, 조정해야 하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수자로서 내가 배우는 과정도 다르지 않다. 주변에 있는 훌륭한 동료, 학생들과 이런저런 계기로 교류하면서 느끼고 되짚는 것이 나의 연구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계를 제하고 남는 것이 ‘나’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강의실’이나 ‘캠퍼스’라는 말부터 쓰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강의실과 캠퍼스가 그저 수업 내용을 주고받기 위해 존재하는 ‘배경’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집에서 나와 걷고 차를 타고 뛰어서 캠퍼스에 도착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함께하는 풍경, 소리, 냄새, 잡담, 두리번거림, 그래서 외부와는 일정 정도 떨어진 공간에 들어와 여기서 일과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는 사실. 대학교육은 캠퍼스라는 공간이 맺어주는 이런 관계의 망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세계를 경험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우리 중등교육의 현실을 생각하면 대학이 제공하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은 더욱 소중하다. 그런데 외부의 충격으로 이러한 공간이 사실상 닫혀버린 지금, 대학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게 된다.
강의실 없는 수업은 여전히 낯설다. ‘종료’ 혹은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화면은 수업이 끝난 후의 머뭇거림과 눈 마주침, 가끔 이어지는 대화와 토론의 여지를 잘라버린다. 질문과 토론을 감싸는 어색한 침묵과 이따금 분출되는 열기도 컴퓨터 모니터로는 도저히 전달이 안 된다. 자세와 표정, 눈빛의 변화를 볼 수 없으니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 (초등학생인 딸 아이에게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따뜻함이 없다’고 대답한다.) 한 학기 내내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학생도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켜두라고 할 수도 없다. ‘정보’와 ‘지식’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웬만큼 전달되겠지만, 서로에게서 ‘태도’와 ‘판단’을 배울 기회가 크게 위축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여기 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많은 경우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배우고 적응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물론 그 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평등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장비 갖추기,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 과제와 시험, 성적산출 방식 조정하고 익히기 등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다. 하지만 시행착오와 주변의 도움으로 이제 많이들 적응을 한 것 같다.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꽤 있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 앞으로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완전히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그런데 준비, 전달, 참여, 평가 등의 루틴을 위한 ‘팁’을 찾는데 몰두하면서, 물리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 가져오는 더 큰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꾸 미뤄두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만족스러운 해법이 있기 힘들고, 또 대학교육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낯선 환경에서 서로 간의 접점을 만들어나갈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수업에 좁혀서 보자면, 어떻게 하면 ‘인강’으로 수렴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학기에 몇몇 학생들에게 들어보니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후 덩달아 면담 횟수도 크게 줄어서 아쉽다고 한다. 이따금 수업 시간 전후 몇 분간 줌 회의실에서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과제에 대한 상담과 피드백이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상당히 일관된 증언이다. 학생조직이나 대학 기관에서 우선 고민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교수자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한다. 이 상황에 ‘적응’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지 않나.
글쓴이: 김주형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정치학 전공)